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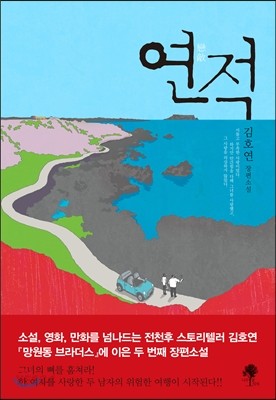
연적
소설, 2015.10
김호연/나무옆의자
죽은 사람과는 어디에서 닿을 수 있는 걸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자는 어디에 머무는 것일까? 살아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면 이들과 닿고 이어지는 것일까? 요단강 건너편 세계나 좀비에 관해 묻는 것이 아니다. 그리울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원망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가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죽은 자에게 닿을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덤을 떠올린다. 어두컴컴한 납골당에 책꽂이처럼 즐비하게 진열된 유골함 중 하나를 떠올리기도 한다. 영영 이별이 서러워 실컷 울어 보냈는데, 굳이 하루 날을 잡아 멀고 번거로운 길을 달려간다. 이미 백골화가 되어버렸는데, 그 마저도 땅속 깊숙이 뭍혀 있어 닿지도 않으니, 그 위로 둥글게 쌓은 봉분을 매만지며 말을 건내고 술을 따른다. 유골함은 무엇인가. 사망 선고가 떨어진 시신을 태우고 남은 산화칼슘과 탄산칼슘 따위의, 불에 타지도 않는 무기물 가루를 담은 것이다. 차갑게 침묵하는 유골 단지를 만지고 망연히 바라봐도 이게 그인지 실감이 나질 않으니 거기에 사진을 붙이고 꽃을 달고 편지도 적어 놓는다.
백골을 깊이 품고 있는 봉분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죽은 자의 분신일까? 시신을 태우고 남은 무기물은 죽은 자의 화신일까.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와 닿을 수 있는 것일까. 혹시, 단지 죽은 사람을 떠올리려니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를 떠올리는 데에 도움이 될 상질물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너무도 막연하여 부득이 죽은자가 남긴 것, 죽은자의 일부, 죽은 자의 흔적을 찾아 애써 의미를 부여하는?
'나'는 한 때 연인이었던 한재연의 1주기를 추모하러 납골당에 갔다가, 그 보다 먼저 와 있던 재연의 전 애인을 만난다. 둘은 좁고 어두컴컴한 납골당에 갇혀있는 재연(의 유골)을 그녀가 생전에 좋아했던 넓고 자유로운 장소에 풀어주기로 의기투합하고 재연의 유골함을 훔쳐낸다. 나, '고민중'은 출판사 편집팀 팀장이다. 자신을 조용하고 고고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고 있지만, 예민하고 옹졸하고 심술궂고 우유부단한 내면을 수시로 드러낸다. 반면 전 애인인 앤디 강은 핼스클럽을 운영하는 근육돼지(화자인 '나'가 자주 애칭했다)로 단순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하고 화통하게 그려진다. 성격 유형으로 줄을 세웠으면 반대편 끝과 끝에 세워져서 절대로 만날 일이 없었을 두 사람이 이미 1년 전에 떠나버린 재연의 전 애인이라는 단 하나의 접점에서 만났다. 재연을 해방시켜주자는 의기에는 투합했지만, 성격과 유형이 극적으로 다르고, 둘의 관계가 실은 '연적'이라는 점에서 이 여행은 막연하고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조강지처도 아니고, '전 애인'이었다. 그러니까, 한 때 애인이었다가 헤어진, 청산 된 관계라는 뜻이다. 그런 전 애인이 사망하고도 한 해가 지난 시점에 단지 유골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런 여행을 한다고? 그래서 유골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야 뭐, 사람에 따라, 또 관계의 깊이에 따라 사연에 따라 유골이 가지는 무게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들을 따라 나설 때는 마뜩지 않은 기분이었는데, 이 막연하고 위태로운 여행은 제법 매력이 있다. 안산, 주평, 남해, 여수, 제주 - 고민중과 앤디 강이 각자 한재연과 함께 다녀온 여행의 추억을 소환하고, 이를 다시 두 연적이 되짚어 간다. 분명 점잖고 고고했을 고민중이지만 유독 앤디 강에 대해서 만큼은 삐딱하고 모진 속내를 드러내는 장면이 재미있다. 중간 중간 고민중, 앤디 강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한 한재연의 인생 여정도 그려진다. 아름답고도 고단했던 여행은 서울에 돌아와서도 쉬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죽음은 없어짐[無]이 아니다. 죽은 자는 죽은 상태로 분명하게 존재하고, 산 자는 그의 부재(不在)와 함께 산다. 없는 것이 아니고 부재로 존재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이에게 죽은 이의 부재는 빈 자리일 수 있고 결핍일 수도, 다른 숙제일 수도 있다. 산 자는 여전히 오감에 갇혀있으니, 모든 존재를 오감 안에서 인식할 수 있길 원한다. 그래서 부득이 둥글게 쌓은 무덤을 매만지고, 차가운 무기물에 불과한 유골을 끌어안는 것이다. 이로써 죽은 자의 부재는 실존이 되고, 가슴에 묻었던 죽은 자에 관한 응어리가 손으로 만져 진다. 만져 지지 않는 응어리를 만져 지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야 응어리를 풀어내고 산 자는 계속 살 수 있으니까. 누구나 언젠가는 죽은 자가 될텐데, 그 때 까지는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소설을 읽고 나니,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하고 싶어졌다.
'책, 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 계속해보겠습니다 (1) | 2022.10.05 |
|---|---|
| [책] 밥상의 말 - 파리에서, 밥을 짓다 글을 지었다 (1) | 2022.09.30 |
| [책] 시인 - 마이클 코넬리 (0) | 2022.05.13 |
| [책] 화재 감시원 - 코니 윌리스 걸작선1 (0) | 2022.05.02 |
| [책] 아무튼, 술 (0) | 2022.02.27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Ilvolo
- 코니윌리스
- 리알토에서
- 밥상의 말
- 김영하
- 진원 김지훈
- Ilmondo
- 독후감
- 나는술을정말로싫어한다고
- 원고지를앞에둔당신에게
- 그리운이에게
- I'll see you again
- 김혼비
- 화제감시원
- callofthewild
- 팬텀싱어4
- 도리우미
- PeterSwanson
- 아무튼술
- 식민지근대화
- ShirleyBassey
- 책
- 가사와 번역
- 실패를모르는멋진문장들
- 삼행시집
- TheKindWorthKilling
- jimmyfontana
- 추릴스릴러
- Sal da vinci
- 반일종족주의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